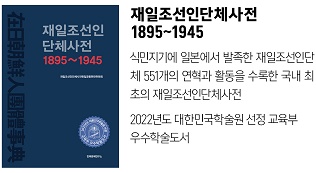어느 고위직 공무원 한 분이 차관님께서 주재하시는 회의에 참석하러 가시는 중이었더란다. 고급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서 깜빡 졸다 보니 시간은 촉박한데 자동차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더란다. 당연히 거리에 차가 막혀서 그랬던 거란다. 그 공무원 나리께서 조급한 마음에 창문을 내리고 바깥을 내다보더니 기어이 한마디 중얼거리셨단다.
“하여튼 자동차 회사마다 저런 싸구려 자동차를 마구 만들어서 내다 파니까 아무나 자동차를 굴리고 다니는 바람에 거리가 이렇게 막히는 거라고. 길거리가 아예 주차장이구만? 쯧쯧….”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대중화된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비해 구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걸 선도한 게 바로 1970년대 중반에 나온 국산차 포니(Pony)다. 포니 한 대 가격은 당시 서울 시내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과 맞먹었다고 한다. 디자인이나 성능면에서 요즘 승용차에 비할 바가 아니었는데도 그랬다.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씩’… 장밋빛 청사진
 | |
| ▲ <보람찬 내일-10월유신의 미래상>, 문화공보부 10월유신을 결행함으로써 ‘100억불 수출, 1000불 소득’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선전한 홍보물. | |
| ⓒ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 | |
1972년 ‘시월유신’ 국민투표를 앞두고 전국 방방곡곡에 마구 뿌려진 전단지를 아시는가. 신동우 화백의 만화로 도배된 그 전단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건 ‘100억불 수출 1000불 소득’ 문구였다. 그보다 훨씬 실감나게끔 눈에 확 들어온 문구와 그림은 따로 있었다. 유신헌법에 찬성표를 던지면 10년 후인 1980년대 초반이 되면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씩 굴리게 될 거라는 장밋빛 청사진이었다.
본격적인 ‘마이카(My car) 시대’는 그보다 훨씬 뒤인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열렸다. 이제는 자동차를 두 대 이상 굴리는 집도 흔해졌다. 어디를 가든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헤매는 일이 잦다. 도심 속으로 들어가면 적지 않은 주차료를 감수해야 한다. 자칫 방심했다가 수만 원에 달하는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받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자동차를 몰고 나가면 그야말로 주차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어디 그뿐인가. 별도로 표지판을 걸어서 그 위치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도 한다. 고마운 일이다.
이런 표지판, ‘대략 난감’하다
 | |
| ▲ 대략 난감한 표지판 하나 | |
| ⓒ 송준호 | |
그림에 잡힌 안내표지판을 보자. 위는 전북 전주시 근처에서 찍은 안내표지판 사진이다. 대충 봐도 좀 특이하지 않은가. 거리 어디서든 흔해 빠진 표지판 아니냐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보길 권한다. 디자인이 창의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공영주차장’ 바로 밑에 쓴 영문자 표기 ‘Gongyeongjuchajang’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옳기는 하다. 표지판에 적힌 병음을 더듬어가며 읽으면 ‘공, 영, 주, 차, 장’이라고 읽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 누구더러 읽으라고 적어 걸어 놨을까.
거리의 안내표지판에 건물이나 도로의 명칭을 우리말과 영문으로 병행해서 표기하는 건 오래 전부터 보편화된 일이다. 영문 표기는 당연히 우리말을 잘 모르는 외국인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속의 표지판의 문구도 주차할 곳을 찾을 외국인에게 공영주차장의 위치를 알려 주기 위해 새겨졌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외국인이 이런 영문자 표기를 읽고 ‘공영주차장’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혹시…, 글로벌 시대고 하니까 우리 운전자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고 싶었던 걸까? 그 자리에는 퍼블릭 파킹(Public Parking) 같은 말이 들어가야 합당한 것 아닐까. ‘사소한 것 같지만 한 가지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표지판을 바라보고 있자니 슬그머니 호기심이 생겼다. 표지판에 적힌 화살표 방향으로 100미터를 가봤다. 열심히 찾아봤지만, 그 언저리 어디에도 주차장 모양을 갖춘 공간은 없었다.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공영주차장이 있던 자리에는 이미 몇 년 전에 연립주택이 들어섰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과거에는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확실히 있기는 했던 모양이다. 그곳에 연립주택 허가를 내줬다면 표지판 역시 내려야 했을 것이다.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그대로 두고 있는 걸까. 요즘 애들 말로 참 ‘대략 난감한’ 표지판이다.
<2014-06-15> 오마이뉴스
☞ 기사원문: ‘공영주차장’을 영어로 쓰라고 했더니…



![img-top-introduce[1]](/wp-content/uploads/2016/02/img-top-news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