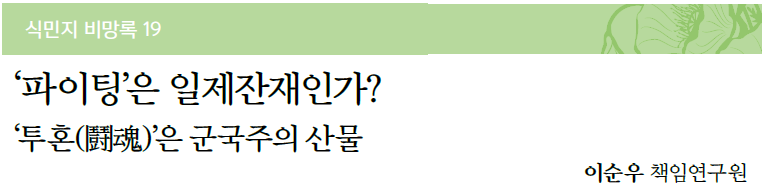
지금의 국립국어원이 ‘국립국어연구원’으로 불리던 시절인 지난 2004년 9월, 일상용어의 하나로 깊이 자리매김한 ‘파이팅(화이팅)’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를 공모한 결과 ‘아자’라는 말을 사용할 것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한때나마 여러 매체를 통해 ‘아자 아자’라는 표현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으나, 그나마도 최근에 와서는 ‘아자 아자 파이팅’의 형태로 회귀하는 바람에 이 시도는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았다. 한번 굳어진 언어습성을 고치기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한다.
이 당시 ‘파이팅’이라는 말을 고치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 당최 국적불명의 용어였던 탓이었다. 영어권에서는 대개 응원구호로 “고 포 잇(Go for it!)”이라거나 “킵 잇 업(Keep it up!)” 정도의 말을 사용하며,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간바레(がんばれ)” 또는 기껏 “화이토(ファイト; Fight)”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알려진다. 따라서 “파이팅(Fighting!)”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록 영어식 표현이기는 하나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 뜻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던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이 용어가 일제잔재라는 얘기도 종종 제기된 바 있었다. 이를 테면 카미카제특공대가 최후 출격을 앞두고 외치는 구호가 바로 ‘파이팅’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뜻도 모르고 함부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여부에 대한 고증이 미흡하여 정말 그러했던 것인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 파이팅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그것이 일제잔재와 결부된 결과물이라는 지적은 과연 사실일까?
이에 관한 흔적을 뒤져보면 독립신문 영문판인 <디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1897년 2월 20일자에 수록된 석전(石戰, stone fight) 혹은 편전(便戰, 편싸움)을 더 이상 금지시키지 말 것을 주장하는 논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찾아낼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파이팅 스피릿’은 간단하게는 ‘투지(鬪志)’를 말하며, 좀 더 그럴싸하게는 상무정신(尙武精神)과 같은 것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 돌로 하는 싸움은 일반 대중에게 위험하므로 석전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막대기로 하는 싸움이라면 왜 정부가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떠한 이유도 우리는 찾아낼 수 없다. 물론 이들은 대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빈 공터에서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다. 조선인들 사이에는 거의 ‘파이팅 스피릿(fighting spirit)’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자에 의해 서로가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 설령 참가자들이 조금은 위험하더라도 이러한 종류의 스포츠는 장려되어야 한다.

▲ ‘파이팅 스피리트’의 초기 용례가 수록된 『동아일보』 1926년 9월 5일자 관련기사.(왼쪽) 『동아일보』 1932년 1월 13일자에 수 록된 황을수의 기고문에는 ‘파이팅 스피리트’를 ‘열렬한 투지’라는 뜻이라고 적고 있다.(오른쪽)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동아일보> 1926년 9월 5일자에 수록된 ‘동아일보사 주최 구락부야구연맹전’ 관련 후속보도내용이다. 여기에는 휘문고보 운동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중앙구락부의 서상국(徐相國) 감독이 남긴 경기후 소감이 적혀 있다.
…… 나는 이번 리그전에 선수의 한 사람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비평을 하기는 어렵고 우리 중앙(中央)구락부에 대한 이야기나 하려고 합니다. 이번 우리 중앙이 대패한 원인은 첫째로 ‘파이팅 스피리트’가 부족하였던 것과 둘째로는 연습이 충분치 못하였던 것인데 연습에 있어서 우리만 아니라 다른 구락부들도 모두 그러하여 스코어에 실책이 많은 것은 가장 유감이었습니다. …… (하략)
또한 <동아일보> 1932년 1월 13일자에는 황을수(黃乙秀) 선수의 기고문인 「이역(異域)에 빛난 권투계 회고(拳鬪界 回顧)」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에도 ‘파이팅 스피리트’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특히 그 뜻이 ‘열렬한 투지’에서 나온 것임을 적어둔 대목이 확연히 눈에 띈다.
전수대학(專修大學)의 신태영(申太泳) 군은 6대학 리그전에도 출장하여 군의 독특한 ‘파이팅 스피리트[열열(熱熱)한 투지(鬪志)]’를 수만 관중에게 보여주었으며 정영길(鄭寧吉) 군도 중경(中京)까지 원정하여 군의 신기한 묘기로 무수한 관객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여 주었다. …… (하략)

▲ 『조선중앙일보』 1935년 3월 11일자에도 ‘파이팅 스피릿’ 제하의 기사가 남아 있다.(왼쪽) 『동아일보』 1935년 12월 4일자에는 독일에서 개최될 제4회 동계올림픽 출전선수로 김정연(金正淵)이 남긴 ‘분투하고 오겠습니다’라는 자필서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 <조선중앙일보> 1935년 3월 11일자에서는 「파이팅 스피릿으로 무보당당(武步堂堂)히 진출(進出)」 제목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약간 앞서 <동아일보> 1935년 1월 1일자(신년호)에서는 관서축구심판협회의 양병지(楊秉祉)가 쓴 「선수자격을 엄선함이 가(可)함」 제하의 기고문에는 “…… 그 다음으로는 선수가 너무 투지(鬪志) 즉 ‘파이팅’이 결핍하다고 본다. 그리고 선수의 운동정신에 있어서는 권투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편이라고 본다(이는 특히 아마추어임을 말함). …… 운운”하는 구절이 나온다. 이 즈음에 와서 투지라는 표현이 그냥 ‘파이팅’ 한 마디로 축약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또한 <동아일보> 1938년 10월 25일자에 이문호(李文鎬)가 쓴 「신궁경기총평(神宮競技總評) (1) 농구대회」 제하의 기고문에도 마찬가지로 ‘파이팅’이라고만 적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 제1회전에 루씨(樓氏)에게 무념의 석패를 한 경성여사(京城女師)팀은 부상 중의 선수가 있었으며 라스트의 파이팅이 약(弱)하여 그 노련한 기술을 완전히 발휘치 못하고 둘러간 것은 큰 유감이라 않을 수 없다. 또 부산고녀(釜山高女)에게 패한 호남대표 광주대화고녀(光州大和高女)의 건투(健鬪)를 상찬(賞讚)한다. …… (하략)
그리고 <동아일보> 1938년 10월 28일자에 수록된 「소강부대지휘관 곤도소장약력(近藤少將略歷)」 제하의 단신기사를 보면 “…… 현직(現職)에 보(補)된 자성준민(資性俊敏)하여 화이팅 스피리트에 부(富)하고 침용과감(沈勇果敢)으로써 알려있어 주지(住支; 중국에 머뭄) 경험의 풍부하기로 장왕(長汪)의 주(主)라고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상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파이팅이란 말은 그 자체가 일제잔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투지(鬪志)의 번역어인 ‘파이팅 스피리트’에서 시작되었다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파이팅’이라고만 부른 채 스포츠용어 등을 거쳐 일상생활어휘의 하나로 정착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것이 응원구호로 정착된 것은 언제부터의 일일까? 짐작컨대 일제강점기에도 응원구호로써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여겨지지만 구체적인 흔적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 대신에 좀 더 세월이 지나 1964년 동경올림픽 때의 신문기사를 보면, 응원구호로서 ‘파이팅 코리아’라는 것이 등장했던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매일신보> 1943년 3월 13일자에 수록된 육군항공사관학교 탐방기사에는 ‘전투혼(戰鬪魂)’이라는 군국주의식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가령, <동아일보> 1964년 10월 12일자에 수록된 「‘파이팅 코리아’, 관중들 우뢰의 응원」제하의 기사에는 “우루과이와의 대전에서 일패도지한 한국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후 힘이 없는 모습으로 퇴장했는데 돌연 관중석에서 ‘파이팅 코리아’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가 너무나 큰 탓인지 관중석에는 어리둥절한 채 덩달아 박수로 호응해주었다”고 적고 있다. 곧이어 <동아일보> 1964년 10월 14일자에는 “한국남자배구팀이 일본팀과 시합을 한 13일 요코하마 문화체육관에는 한국여자배구선수들이 ‘파이팅 코리아’를 소리높이 외치는가 하면, ‘송아지 송아지’라는 노래까지 합창하고 때로는 ‘3,3,7’박수를 보내어 빽빽이 들어찬 일본사람들을 어리둥절케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파이팅’의 뜻을 담은 것으로 ‘투지’와 거의 동일시되는 단어는 바로 ‘투혼(鬪魂)’이다. 그러나 이 ‘투혼’이라는 표현은 금기시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지적해두고자한다. 그 뜻으로만 보자면 ‘투지’나 ‘투혼’이나 상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이나, 우리의 전통적인 언어용법으로 보건대 투지의 경우만 풍부하게 그 용례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고문헌 자료를 뒤져보면 투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와 비슷한 뜻으로 건투(健鬪), 분전(慣戰), 분지(奮志), 전의(戰意) 등도 곧잘 눈에 띈다. 하지만 유독 투혼이라는 표현은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 여기에서 보듯이 군국주의자들의 용어인 ‘투혼’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정반대 의미로 둔갑하여 서적의 제목에 채택된 용례는 무수히 찾을 수 있다.(<동아일보> 1955년 9월 2일자)
여기에서 말하는 투혼이라는 용어가 무더기로 등장하는 때는 일제패망기에 전시체제가 한창 판을 치던 시절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당시에 발간된 『매일신보』와 같은 총독부 기관지에는 ‘불굴의 투혼’이니 ‘전투혼(戰鬪魂)’이니 ‘대화혼(大和魂, 야마토다마시)’이니 ‘특공혼(特攻魂)’이니 하는 표현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수록된 바 있었다. 이렇게 이식된 일제의 유산은 해방 이후에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일상용어의 하나로 고스란히 남아 스포츠경기를 석권한 공로를 칭송하는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항일독립투쟁의 업적을 일컫는 때조차도 툭하면 ‘투혼’이라는 수식어를 동원하기 일쑤였으니 참으로 아이러니칼한 장면이 아닐 수 없겠다.
거듭 말하거니와 ‘투혼’이라는 표현은 군국주의의 소산물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그것을 그대로 ‘파이팅’의 대체어로 삼는 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고 보니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축구팀의 유니폼에 투혼이라는 글자를 써넣었다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일이 기억난다. 잘 싸우고 오라는 뜻을 담은 것이라면 차라리 ‘파이팅’이라고 해도 무방했을 텐데, 어원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일제의 침략군대에서나 썼을 법한 ‘투혼’이라는 용어로 헛다리를 짚은 것이 그저 아쉬울 따름이다.



![img-top-introduce[1]](/wp-content/uploads/2016/02/img-top-history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