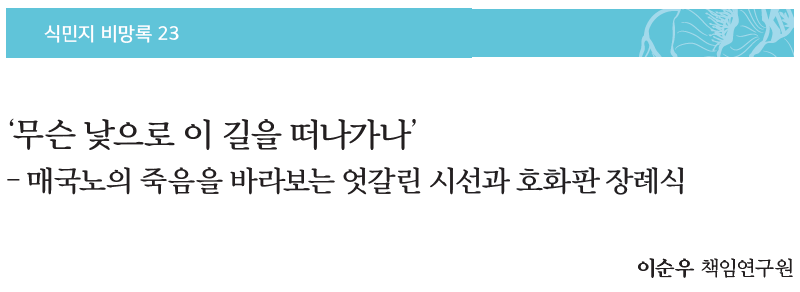
그도 갔다. 그도 필경 붙들려갔다. 보호순사(保護巡査)의 겹겹 파수(把守)와 철비전벽(鐵扉磚壁)의 견고한 엄호도 저승차사의 달겨듦 하나는 어찌 하지를 못하였으며 드러난 칼과 뵈지 않는 몽둥이가 우박같이 주집(注集)하는 중에서도 이내 꼼짝하지를 아니하던 그 달라진 동자(瞳子)도 염왕(閻王)의 패초(牌招) 앞에는 아주 공손하게 감겨지지 않지를 못하였구나. 이때이었다. 너를 위하여 준비하였던 것이 이때이었다. 아무리 몸부림하고 앙탈하여도 꿀꺽 들이마시지 아니치 못할 것이 이날의 이 독배(毒杯)이다. …… 살아서 누린 것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이제부터 받을 일. 이것이 진실로 기막히지 아니하랴. 문서는 헛것을 하였지마는 그 괴로운 갚음은 영원한 진실임을 오늘 이 마당에서야 깨닫지 못하였으랴. 어허, 부둥켰던 그 재물은 그만하면 내놓았지! 앙탈하던 이 책벌(責罰)을 이제부터는 영원히 받아야지!

▲ <매일신보> 1926년 2월 15일자에 게재된 이완용 후작 사망 부고. 장지는 전라북도 익산이며, 영결식장은 용산역전광장으로 표시되어있다.
이것은 ‘매국노의 대명사’ 이완용(李完用)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동아일보> 1926년 2월13일자에 수록된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제하의 사설이다. 총독부 당국의 검열로 삭제처분을 받은 이 기사에는 그가 죽어서도 영원한 책벌을 받을 처지가 되었음을 질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죽은 그에게서 그 무슨 뼈저린 반성과 후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도 싶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매일신보> 1926년 2월 13일자에는 그의 죽음에 대한 단평기사에 총독부 기관지다운 대목이 등장한다.
죽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성스러운 것이니 평시에 그에게 위해를 끼치고자 하던 이며 그의 태도를 오해하며 비난하던 사람이기로 어찌 사나이답게 그의 죽음을 조상할 한 줄기 눈물이 없겠는가?
제 아무리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때문에 이완용의 죽음에까지 눈물 한 방울이라니, 이것이 어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말이다. 돌이켜보면 그만큼 세상 사람의 이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바 ‘한일병합’의 대업을 익찬(翼贊)한 공로를 앞세워 일제에게서 주어지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이는 없었다. 나아가 그에게는 죽음까지도 호사스러웠다.

▲ <매일신보> 1915년 9월 25일자에 게재된 이왕직장관 민영기 남작의 영결식장 사진이다. 영결식은 훈련원광장에서 거행되었으며 장지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금당리였다.
그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천황은 위문의 뜻으로 포도주를 내리는 한편 특지(特旨)로써 정이위(正二位)와 대훈위(大勳位) 국화대수장(菊花大綬章)의 서위 서훈을 발표하였다. 그의 장의가 확정되자 계속하여 어사태서(御沙汰書)와 함께 제자(祭資), 폐백(幣帛), 신찬(神饌), 어신(御榊) 등의 하사가 있었다.
2월 18일에 거행된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기마경찰과 조선보병대가 선두에서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영구마차를 인도하였으며, 운구행렬은 인왕산 아래 옥인동 저택을 출발하여 경복궁 영추문 앞, 광화문통, 종로 보신각, 남대문통, 한강통을 경유하여 용산역전의 광장으로 길게 이어졌다. 이곳에서는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은 물론이고 칙사(勅使)와 어사(御使), 그리고 조선군사령부의 의장대(儀仗隊)를 포함한 2천여 명의 조문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영결식이 한 시간 반 남짓 진행되었다.
이완용의 장례 영결식장으로 용산역전 광장이 선정된 것은 장지(葬地)인 전라북도 익산군 낭산면으로 향하는 특별열차가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까닭이었다. 실제로 그의 시신을 실은 특별열차는 영결식이 끝난 저녁 무렵 장지에 제일 가까운 호남선 강경역(江景驛)을 향해 이동하였고, 다음날 새벽에 현지에 도착하여 육로로 운구가 이뤄진 뒤에 오후 나절에야 매장이 이뤄졌다.

그런데 일제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은 친일귀족들이 죽었을 때 용산역전 광장에서 이들의 영결식을 거행한 사례가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을사오적의 하나인 박제순(朴齊純, 1916년 6월 사망)의 경우가 그러했고, 이완용보다 한해 앞서 죽은 송병준(宋秉畯, 1925년 1월 사망)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지방에 묘소를 정하였기 때문에 용산역전에서 장례가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송병준의 시신은 육로를 통해 노량진, 안양, 수원, 김량장을 거쳐 용인 현지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에 장지가 있을 경우 경성역전(京城驛前)을 선호하기도 하였지만, 용산역전 쪽을 이용하는 사례가 더 빈번했다.


▲ 새문밖 독립문광장에서 거행된 고영희 자작의 영결식 광경이다.(<매일신보> 1916.2.2. 왼쪽) <경성일보> 1929년 3월 10일자에 게재된 이하영 자작의 장례식 광경이다. 대륙고무신의 사장이기도 했던 그는 고양군 은평면 홍제외리에 묻혔고, 영결식은 독립문앞 공터에서 거행되었다.(오른쪽)
그렇다면, 이들과는 다르게 먼 지방이 아니라 서울 인근 지역에 묘터가 정해지는 경우는 어떠했을까?
이런 때는 각자가 서울을 빠져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인접 외곽지의 너른 공터에서 영결식 또는 반우식(返虞式)이 치러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가령, 양주군 일대를 포함한 서울 동쪽 지역이 장지라면, 동대문 밖의 거장(車場, 수레마당)이나 신설동 안감천(安甘川) 다리 앞, 또는 청량리역전이 선택되는 방식이다. <매일신보> 1915년 3월 18일자에는 민영휘(閔泳徽) 자작의 처 평산 신씨(平山 申氏)에 관한 장례기사 한 토막이 실려있는데, 여기에서 ‘수레마당’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경성부 경운동에 거하는 자작 민영휘 씨의 부인 정경부인 평산 신씨는 그간 황달(黃疸)의 숙환으로 여러 날 치료를 하다가 약석이 효험을 이루지 못하고 병세가 점점 위독하여 지난 15일 오후 7시에 필경 별세하였는데 향년이 65세요, 평일에 현숙한 이름이 높았던 부인이라. 오는 21일 이른 아침에 경운동 집에서 발인하여 강원도 춘천(春川) 읍내 묘지에 안장하고 25일 오후 4시 동대문 밖 수레마당에서 반우의 예를 행한다더라.

▲ <동아일보> 1922년 3월 10일자에 소개된 경성사진관 자동차부의 ‘영구차’ 관련 광고. 영구차의 등장은 며칠에 걸쳐 장지까지 이동해야 했던 종래의 장례풍경을 크게 바꾸어놓게 된다.
뚝섬이나 살곶이다리 방향에 장지가 정해지는 경우라면, 훈련원 광장과 동묘(東廟) 앞 또는 왕십리역전과 같은 장소가 선호되었다. 또한 미아리나 우이동 방향이라면 동소문 밖 삼선평(三仙坪)과 같은 곳에서 영결식이 거행되었다. 서울의 서남쪽으로는 애오개 너머 늑교 (勒橋, 굴레방다리)나 공덕리와 같은 공간이 사용되었고, 이태원공동묘지로 향하는 경우에는 후암동 두텁바위에서 영결식이 곧잘 이뤄지기도 했다.
그리고 고양군 일대를 포함한 서울 서북 지역을 향해 나아가는 경우에는 새문 밖 독립문(獨立門) 앞이나 무악재 너머 홍제원(弘濟院) 광장이 영결식장으로 선택되는 때가 많았다. 흔히 독립문 일대라고 하면 모화관과 영은문은 말할 것도 없고 독립협회의 독립관이나 일진회가 차지했던 국민연설대(國民演說臺)와 같은 것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이곳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이승을 하직한 서울 사람들의 장례 영결식이 무수하게 벌어지던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곳에서 영결식이나 반우식이 거행된 사례를 찾아보니, 이건하(남작, 1913년), 고영희(자작, 1916년), 민종묵(남작, 1916년), 최상돈(중추원부찬의, 1916년), 백남신(육군부령, 1920년), 홍충현(대정친목회 이사, 1925년), 이하영(자작, 1929년)과 같은 친일인사의 이름이 먼저 눈에 띈다.
그밖의 인물로는 이봉래(내부협판, 1916년), 김사준(찬정, 1917년), 박명환(시종원부경, 1918년), 이병숙(대정친목회 평의원, 1916년), 조석진(화가, 1920년), 이근홍(경기관찰사, 1922년), 이응선(평화당약방, 1927년), 배동혁(중추원의관, 1928년), 이용우(동덕여자고보 이사, 1928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이곳 독립문 지역은 1929년 7월 1일에 ‘경성부영장재장(京城府營葬齋場)’이라는 이름의 홍제내리 화장장(弘濟內里火葬場)이 생겨난 이후로 무악재를 넘나드는 영구차 행렬이 더욱 빈번하게 오가던 곳으로 변하게 되었다. 더구나 독립문 바로 옆에는 사형수에 대한 처형이 이뤄지던 악명 높은 서대문형무소가 자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래저래 죽음과는 무관한 공간이 아니었던 듯하다.
행여나 용산역전이거나 훈련원 터이거나 동대문 앞이거나 독립문 옆과 같은 장소를 스쳐 지날 일이 있거든, 바로 이런 공간이 죽어서까지 호사를 누린 친일귀족들이 이승과 하직한 곳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들이 저지른 생전의 악행을 함께 떠올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라는 말 한마디로 덮어버리기에는 그들의 죄상이 너무도 크고 깊기에 하는 얘기이다.



![img-top-introduce[1]](/wp-content/uploads/2016/02/img-top-history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