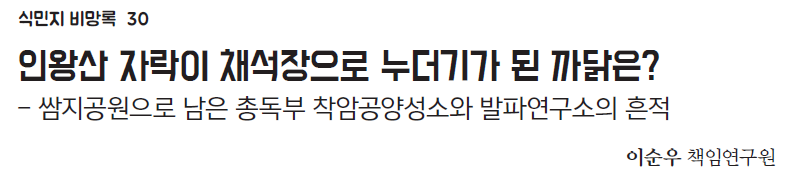
<매일신보> 1937년 6월 22일자의 지면에는 임사일(林士一)이라는 사람이 기고한 연재물 「창의문 밖의 기억」 첫 회가 수록되어 있다. 이 기사는 그 다음달 7월 2일에 이르기까지 6회에 걸쳐 분할 연재되었는데, 창의문 밖을 벗어나 부암동 중턱의 무계동천과 윤웅렬 별장에서 시작하여 석파정을 거치고 골짜기 아래의 부침바위, 세검정, 연융대, 홍지문, 보도각 백불(白佛) 일대를 죽 탐방하는 행로가 그려져 있다.
이 글을 따라 읽다 보면,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듯 아닌 듯 이 일대의 옛 모습을 상상으로나마 그려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런데 이 연재물에는 여기저기 채석장에 관한 언급이 유달리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일신보> 1937년 6월 27일자에 수록된 ‘4회’ 연재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묘사되어 있다.
부침바위 정면으로 건너편에 새로 지은 한씨(韓氏)의 정자(亭子)를 바라보면서 큰길을 그대로 잡아 내려가면 인왕산 후록 둔부(臀部)에 당(當)할 만한 위치에 채석장(採石場)이 있다. 자하문(紫霞門) 밖에서 채석장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곳이 초입의 채석장이다. 벌써 인왕산의 삼분의 일은 파먹어 들어갔다. 그대로 하여 인왕산을 횡단하면 옥인동(玉仁洞) 아방궁(阿房宮: 윤덕영의 집)의 후정(後庭)이 삼각산을 통거리로 들이마실 것이다. ‘따이나마이트’의 폭발하는 그 소리에 이전 세상 같으면 적군이 대포를 놓고 쳐들어온다고 피난준비에 야단법석이 날 것이다. 이전 세상이 아니라도 그 어마어마한 소리를 처음 들을 때에는 그랬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 아이들도 ‘캉’ 소리가 나면 또 돌 깨트렸다고 할 뿐 태연자약이다. 그리하여 자하문 밖 경치는 벌써 반 이상이 감쇄되는 중이다.
실상 인왕산 주변을 살펴보면 예전에 채석장으로 사용한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홍제동 쪽에 자리한 문화촌현대아파트 104동의 후면에도 바로 이러한 흔적이 남아 있다. 여기에는 ‘쌈지마당놀이터’라는 이름으로 남은 작은 공터가 보이고, 그 동편에 절개지 절벽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광경에서 이곳이 한때 채석장이던 공간임을 실감하게 된다.

▲ 서울 홍제동 문화촌현대아파트 104동의 후면에 자리한 쌈지마당놀이터 전경

▲ 옛 홍제동 채석장의 한쪽 바위면에 새겨진 마애관음보살입상의 모습
가만히 살펴보니 한쪽 바위면에는 가히 이곳의 명물이라고 할 만한 ‘마애관음보살입상’ 한 구가 새겨진 모습도 눈에 띈다. 기껏해야 반세기 남짓 그 안쪽 시기에 만들어졌을 이 보살상이 정확하게 어느 때 누구에 의해 조성된 것인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듣기로는 1972년 이후 1994년까지 문화촌현대아파트 101동 자리에 사현사(沙峴寺)라는 사찰이 옮겨와 있던 기간에 이 절에 다니는 독실한 신자가 이를 조성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곳 홍제동 채석장은 어떤 내력을 지닌 곳이었을까? 이 장소에 관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官報)의 부록으로 간행되던 <통보(通報)> 제118호(1942년 6월 18일자)에 탐방기 하나가 남아 있다. 여기에는 「현지보고(2) 착암공양성소」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 “본란은 고도국방건설을 목표로 조선 내에 약동하는 각종 시설을 있는 그대로 평이 간명하게 소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기획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홍제정(弘濟町)의 정류소에서 버스를 내려, 오른쪽으로 꺾어 야채밭을 반천(半粁, 500미터) 남짓 나아가면 눈앞에 황색 빛을 띤 밝은 건물이 나타난다. 경성부 홍제정 산(山) 1번지, 이런 복잡한 지번인 ‘조선총독부 착암공양성소(鑿岩工養成所)’. 산금반도(産金半島), 지하자원 적극 개발의 요청에 응하여 소화 13년(1938년) 8월 1일에 개설된 광산전사(鑛山戰士)의 연성도장(鍊成道場)이다.
4월, 8월, 12월, 1년을 3기로 나눠 1기에 약 4개월, 이미 530여 명의 졸업자를 배출한 이 양성소에는 지금 제12기생, 이번 4월 입소한 50여 명의 젊은 산남(山男, 산사나이)들이 착암부(鑿岩夫)로서 홀로서는 어봉공(御奉公)의 날을 마음에 그려가면서, 인왕산 뒤편 암벽에 묵묵히 수행의 투혼을 끓어오르게 하고 있다.(중략)
매일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밥, 궁성요배,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 라디오체조를 행하고 발랄하게 현장으로 향한다. 매주 화요일에는 소장인 키노(木野) 본부(本府) 산금과장(産金課長)의 수양훈화가 행해진다. 1일 8시간의 실습을 마치고 숙사로 돌아오면 즐거운 저녁밥이다. 그리고 밤은 녹초가 되어 피곤해진 몸으로, 내일의, 또 한 번 큰 미래의 설계를 그리면서 유쾌한 잠자리로 빠져들어 간다. 그리하여 4개월, 배우고 익힌 이 팔뚝에 착암기를 힘차게 쥐고, 지하자원개발의 기운찬 광산전사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 경성부 홍제정에 착암공양성소가 개설될 예정임을 알리는 <매일신보> 1938년 5월 28일자 보도내용

▲ <통보> 제118호(1942.6.15)에 수록된 착암공양성소 실습 광경

▲ <매일신보> 1938년 11월 16일자에 수록된 착암공양성소 입소허가자 명단을 살펴보면, 전체 50명 가운데 일본인은 9명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는 조선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홍제동 산 1번지’는 실상 인왕산의 서쪽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번이다. 이 가운데 지금의 홍제동 채석장 터 일대에 들어선 것이 ‘착암공양성소’였던 것이다. 공기착암기와 전기착암기를 다루는 숙련공을 배출하는 실습교육장인 이곳은 일제가 1937년에 추진한 이른바 ‘산금(産金)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만들어졌다.
이 당시 중일전쟁의 발발로 전시체제가 본격화하면서 광물자원의 확보가 더욱 긴요한 상황이 되었고, 그 가운데 특히 금(金)은 결제수단으로서 전통적인 위상과 더불어 장차 ‘동아공영권(東亞共榮圈)’ 내에서 기준화폐로 사용될 엔화(圓貨)의 통화 신용유지를 위해서라도 증산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던 시절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금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을 집중 강구하여 1936년 기준 연간 20톤 규모이던 것을 5년 사이에 연간 75톤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국책(國策)으로 삼게 되었다.
1938년 5월 12일에 공포된 제령 제20호 조선중요광물증산령(朝鮮重要鑛物增産令)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금을 비롯한 주요 전시 광물자원의 생산은 대개 함량미달로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놀려두고 있던 저품위 광산을 개발하거나 매광(賣鑛)을 촉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를 위해 조선총독이 중요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자에 대해 사업의 착수 또는 사업의 계속을 명령할 수 있다거나 중요광물의 증산을 꾀하기 위해 산금장려비와 시설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이 법령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동시에 총독부 식산국(殖産局) 내에는 종래의 광산과에서 산금과(産金課)를 분리 신설하여 산금정책을 전담하게 하였고, 이때 착암공양성소도 함께 만들어 산금과장에게 이곳의 운영을 맡겼다. 착암공양성소의 설치 이유는 무엇보다도 실무적으로 원활한 금 생산을 위해서는 광산도로의 개설, 송전시설의 보강, 착암공과 광부의 알선이 뒷받침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매일신보> 1938년 7월 31일자에 수록된 개소식 관련 보도내용을 보면, 착암공양성소가 홍제동 일대에 설정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일찍이 총독부에서 그 개소를 준비중이던 착암공양성소는 키노(木野) 산금과장을 소장으로 하여 부내 홍제정 발파연구소(發破硏究所)의 일부를 빌려서 8월 1일부터 개소하기로 되었다. 강습생은 응모자 250명 중에서 50명이 전형 결정되어 이미 양성소 전용의 압기기공장(壓氣機工場) 75마력도 완성하여 이것을 요하는 착암기는 부내 각 판매점에서 다투어가며 기부신청이 있어 벌써 십 수 대가 준비되어 있다.

▲ 총독부 경무국에 의해 홍제내리가 발파연구소 후보지로 선정되었음을 알리는 <매일신보> 1936년 7월 3일자 보도내용
여길 보면 착암공양성소가 들어선 곳은 원래 발파연구소가 있던 구역이라고 되어 있다. 광산개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발파연구소는 1936년 6월에 만들어졌으며, 화약의 제조 및 취급과 관계된 이유로 애당초 총독부 식산국이 아닌 ‘경무국(警務局)’의 소관 기관으로 설정되었다.
그후 산금장려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이에 발맞춰 1940년 7월에 부설기관인 ‘발파기술원양성소(發破技術員養成所)’가 정식으로 설립되기에 이른다. 이곳에서는 광산과 기타 공사장에서 종사할 발파기술원들을 체계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20명 남짓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6개월 간에 걸쳐 화약 종류의 취급과 발파법에 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처럼 두 기관이 하나의 공간에 들어서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폭약을 터뜨리고 또한 착암기로 쉴 새 없이 뚫어대니 아무리 바위산인들 어찌 온전할 리가 있었겠는가.
지금에야 어찌 어찌 세월이 흘러 그 앞에 들어선 아파트 숲으로 인해 조금은 시야에서 가려진 형국이지만,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이곳의 속살을 대면하게 되면 일제가 이 땅에 남긴 생채기들이 이토록 많았던가 하는 점을 저절로 수긍하게 된다.



![img-top-introduce[1]](/wp-content/uploads/2016/02/img-top-history1.png)
